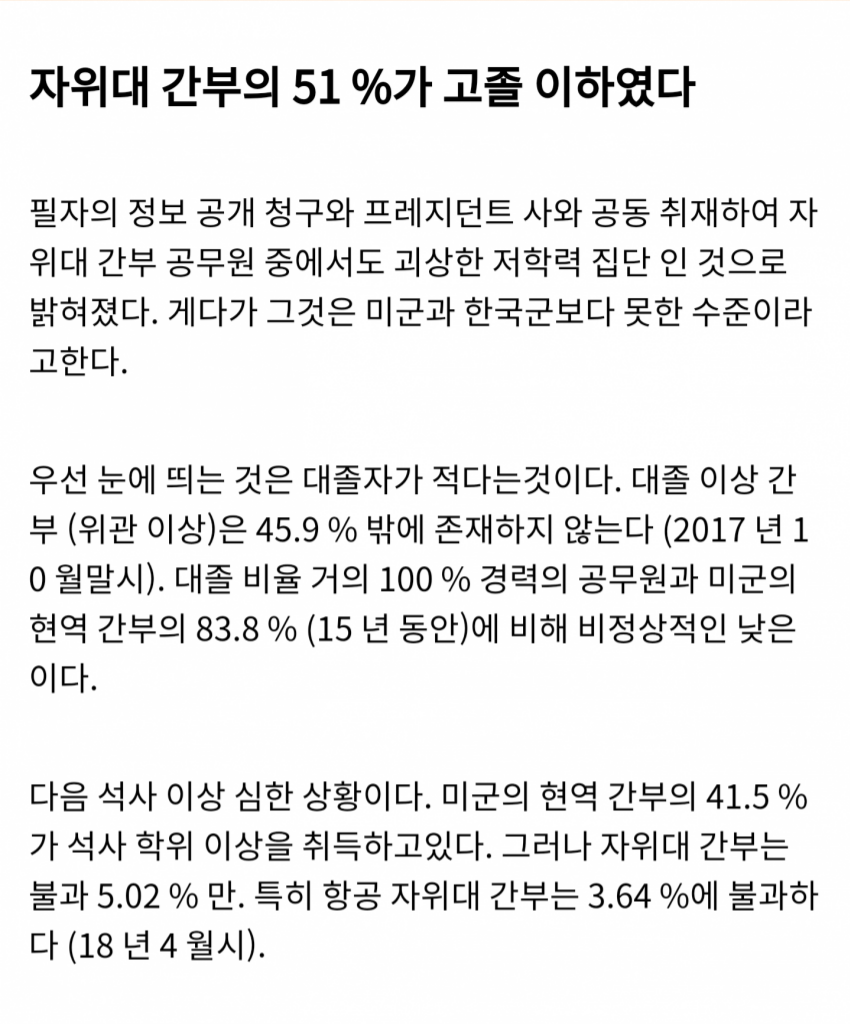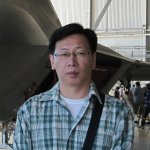중국군의 Z-20형 스텔스 헬기 개발 문제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조회: 9000 추천: 0
작성일: 2021-07-05 10:03:27
<윤석준의 차밀, 2021년 7월 5일>
중국군의 Z-20형 스텔스 헬기 개발 문제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과 미중 간 경쟁 국면 악화를 고려하여 베이징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창당 기념식만 하였고 군사 열병식은 없었다.
이번 행사에서 중앙공산당 당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국가주석을 겸직하는 시진핑은 마오쩌둥(毛澤東) 복장으로 알려진 ‘마오 인민복’을 입고 나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방위적 견제와 경고와 무관하게 중국 ‘독자적 길’을 갈 것이며,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를 지원하듯이 중국군은 이번 100주년 행사를 의미하는 각종 ‘숫자’를 그동안 개발한 첨단 항공기를 동원하여 시진핑 주석의 선언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면 7월 1일을 기념하는 뜻에서 J-20 스텔스기, J-10 전투기, Z-8L 대형 수송헬기, Z-10과 19 공격헬기, Z-20 다목적 헬기와 JL-8 훈련기 71개를 동원하였고, 특이하게 지난해 10월 1일 국경일에는 5대만 나왔던 J-20 스텔스기를 15대 동원하여 전력화에 자신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Z-8L 2대가 대형 수송헬기가 대형 공산당 당기를 공중에서 보였고, 이어 Z-10과 Z-19 헬기 29대가 100주년의 ‘100’ 숫자를 공중 편대로 만들었으며, J-10 전투기 10대가 행사당일 일자인 ‘71’로 편대 비행을 하였고 뒤이어 J-20 스텔스기 15대가 승리를 의미하는 ‘V’ 형태를 JL-8 훈련기 편대가 ‘5가지 오색 연기’를 공중에 각각 수놓았다.
특히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군용기 모두가 중국 독자형으로 실전에 배치된 첨단 공중전력이라며, 이는 중국 항공산업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자랑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이 미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약 350대 보유하였다며, J-20 스텔스기 40대만 보유한 중국 공군이 추가로 생산된 J-20을 보유하여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면서, 회전익 헬기 경우 10톤의 Z-20 다목적 헬기에 이어 13톤의 Z-8 헬기를 15톤의 Z-8L 헬기로 개선하였으며, 현재 이를 Type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LHD)에 탑재하여 상륙강습용 기동헬기로 개선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6월 22일 『Global Times』는 지난 4월 23일 남해함대 사령부에 배속된 Type 075형 하이난함에서의 Z-8L 이착륙 훈련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 동원된 군용기 자랑에서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와 비교시 뒤쳐진 분야는 스텔스 헬기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생산에 들어간 J-20 스텔스기에 이어, FC-31 스텔스기를 함재기용으로 개발 중이며, 2019년에 생산된 GJ-11 스텔스 무인기를 운용 중이다. 해군의 경우 레이더 반사파를 최소화시키는 선체 설계와 전파흡수 코딩페인트를 적용하고 각종 외부무장을 내장시키고 통합형 마스트를 갖춘 1만톤 Type 055형 스텔스 구축함이 작전에 투입되고 있으나, 스텔스 헬기는 아직 없다.

그동안 중국군은 7종류의 헬기 개발에서 주로 결빙 현상 해소, 엔진산소 소비률 감소 등의 고산지대 지상작전 요구 성능과 무장탑재 중량을 늘리기 위한 독자형 엔진 출력 증대에 집중하였고, 이들은 모두 러시아 Kamov, 프랑스 SA, AC 또는 AS 계열 Super Frelon 또는 Eurocopter Dauphin, 영국 Agusta A129 Mangusta와 미국 SH-70 헬기를 모방형이었으며, 스텔스 헬기 공개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Eastpendulum.com 블로그를 운영하는 프랑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 헨리 켄흐만(Henri Kenhmann)이 지난 6월 2일 『Naked Science』에 5월 29일에 촬영한 中國航空工業集團公司(AVIC) 산하 中國航空直升機設計硏究所(CHRDI)가 개발한 Z-20형 다목적 헬기를 기반으로 한 익명의 『Z-20형 스텔스 헬기 모형』을 공개하며, 중국이 스텔스 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9일 『Defense News』 등 서방 매체들은 이번 Z-20형 스텔스 헬기 모형이 2011년 5월 미 해군 씰팀이 오사마 빈 라덴의 제거작전에서 고장에 의해 자체로 파괴한 『UH-60형 스텔스 헬기』 잔해와 정보를 중심으로 개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주된 이유로는 켄흐만이 공개한 Z-20형 스텔스헬기 모형이 Z-20 동체와 유사하며, 엔진과 후미 안정날개를 내장화시켜 소음을 줄였고, 엔진열을 동체 등뼈에 나누어 배출하도록 하고, 선체에 스텔스 코팅을 입혔으며, 회전익 날개를 미 UH-60 4개에서 5개로 개선한 Z-20보다 많은 7개로 늘린 것을 들었다.
이러한 Z-20형 스텔스 헬기 모형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이다. 지난 5월 31일 『Global Times』는 지난 5월 29일 CHRDI가 개발한 Z-20형 스텔스 헬기 모형이 2011년 파키스탄 정보당국의 협조하여 입수한 스텔스형 UH-60 특수전 헬기를 모방한 것이 아닌, 중국의 첨단 항공과학기술을 접목한 독자형 스텔스 헬기라고 자축하였다.
이어 지난 6월 27일 『Global Times』는 중국이 모두 7종유의 헬기를 갖고 있으나, 아직도 제5세대 헬기는 없었다며, 중국군은 동축 회전익, 조종사석의 단일 유리체 구조 적용, 소음감소 장치와 착륙기어 개선 등만이 아닌, 중국산 WZ-10 터보샤프트 엔진, 인공지능(AI) 등 과감한 군사과학기술 혁신과 헬기개발사들 간의 제5세대 스텔스헬기 개발시합(tournament)을 통해 러시아 의존과 헬기 관련 군사과학기술 결함을 극복하고 있다며 Z-20형 스텔스헬기 모형이 독자형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이다.
첫째, 과거 UH-60형 스텔스 헬기 모방에 의한 구식이라는 평가이다. 2020년 8월 4일 『The War on the Rock』은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 제거작전 당시 2대의 UH-60형 스텔스헬기가 1996년부터 보잉사(Boeing)와 시콜스키(Sikolsky)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나, 2004년에 개발예산 과다와 미래 헬기작전 요구능력과의 불적합으로 전면 취소된 RAH-66A 코만치 스텔스 헬기 시제형 2대이었다면서, 그 중 1대가 고장으로 비상착륙하여 미 해군 씰팀이 파괴한 것이라며, 중국군이 파키스탄 정보당국과 협조하여 이를 입수한 2000년대 초반 헬기 관련 군사과학기술이 접목된 구식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Z-20형 스텔스 헬기 모형이 터보샤프트 엔진 소음과 회전익 날개로 인한 여음을 줄인 2011년 5월 미 해군 씰팀의 UH-60형 스텔스헬기 기능과 유사하게 터보샤프트 엔진을 동체 내로 넣어 엔진 소음을 줄이고 엔진열을 헬기 등 상부로 나누어 발산시켜 적 고공대공 미사일 추적을 덜 받도록 하였으며, 하부 착륙기어를 노출시키지 않고 동체 내부로 집어넣은 것을 들었다.
실제 2013년 9월 4일 『비즈니스 인사이드(Business Inside)』는 중국이 동체를 완전히 포장한 미상의 헬기 모습이 웨이보(weibo) 온라인 영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중국이 조립한 UH-60형 스텔스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가 있었다.

둘째, 헬기의 스텔스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투기와 무인기는 스텔스 효과가 공중작전 임무와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이지만, 헬기의 스텔스 효과는 그 효과 자체가 낮고, 헬기 공중작전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시 너무 과대한 투자-대-비용이라며, 스텔스 효과의 헬기 적용에 부정적이다.
대표적으로 2019년 1월 10일 『The War On the Rock』은 미 육군 UH-60을 개발하는 스콜스키사가 1980년 이래 30여 년간 스텔스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2004년 전면 취소된 RAH-66A 코만치 스텔스헬기 사례에서 증명되듯이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헬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시 고가의 스텔스 효과보다, 중무장, 탐지센서 개선, 기동성 향상 등으로 적 지상군에 대한 ‘가차없는 타격(relentless strike)’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헬기의 경우 적에 대한 ‘가차없는 타격’ 능력 강화가 ‘스텔스(stealth)’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그동안 스텔스 헬기는 고가의 개발비용이 요구되고, 탑재무장이 제한되며, 특히 무인기와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무용론이 나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가 2004년 보잉사와 시콜스키사사 공동으로 개발한 RAH-66A 코만치 스텔스헬기 사업이 취소된 주된 원인이었으며, 현재 미 육군이 차세대 헬기를 장거리 정찰 및 감시와 공격 능력에 방점을 둔 『미래 공격정찰헬기(FARA)』와 『미래 장거리 공격헬기(FLRAA)』로 두는 이유이자, 스텔스 효과에 비교적 낮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이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헬기의 스텔스 효과 적용의 성공사례를 프랑스 유로콥터(Eurocopter)사가 2003년에 개발한 유로콥터 타이거(Eurocopter Tiger) 헬기와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와 프랑스 NH Industries사가 공동 개발한 NH90형 헬기를 든다. 유로콥터 타이거 헬기는 부분적 스텔스 효과와 회전익 축에 오시리스(Osiris) 레이저 광학탐지 센서를 탑재하여 스텔스에 비중을 많이 두기보다, 화력과 생존성에도 비중을 둔 준(準)스텔스(Quasi-Stealth) 헬기이며, NH90형 헬기는 레이더 전자파 감소를 위한 동체설계와 타이타늄 재질을 사용해 스텔스 효과를 보았고 터보샤프트 엔진과 전기추진식을 혼용하여 소음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셋째, 중국군에게 스텔스 헬기 투입 작전 소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지상군이 만일 개발에 성공할 『Z-20형 스텔스헬기』를 투입할 상황을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 대한 은밀한 특수부대 투입, 대만에 군 지휘부에 대한 기습작전, 동중국해 조어대 분쟁 도서에 대한 선제적 점령과 괌 등 미군의 해외기지에 대한 전격 투입작전 등으로 전망하면서, 이외 중국이 주변 14개국 국경지대에서 스텔스 헬기를 투입하여 은밀한 특수작전을 수행할 필요성은 크게 없어 스텔스보다, 강력한 소음을 동반한 중무장으로 ‘가차없는 타격’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점에서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5월 29일 공개된 Z-20형 스텔스 헬기는 스텔스 효과에만 집중하였지, 과연 어느 지상작전에 투입하여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아마도 헬기 연구기관과 업체간 과도한 경쟁(tounament)에 따라 제시된 무리한 모형일 것으로 평가하였다.
심지어 지난 6월 27일 『Defense View』는 중국군이 미 공군의 F-35 스텔스기 투입에 대응하여 저고도용 Z-20형 스텔스헬기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F-35 스텔스기와 Z-20형 스텔스헬기 운용 고도를 고려할 시 무리가 있는 전투상황으로 평가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1999년 세르비아가 격추시킨 미 공군 F-117 나이트 하크 스텔스 폭격기를 기반으로 스텔스 전투기 기본 개념이 가능하여 J-20 스텔스기 생산에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공군이 Z-20 스텔스기를 스텔기 모드와 무장형 모드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향후 전자전(EW) 또는 정보정찰, 감시와 표적(ISRT)기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지상군이 지난 5월 29일 모형으로 공개된 Z-20형 스텔스 헬기를 어느 지상작전과 임무에 투입할런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 제거작전 소요가 중국 지상군에게는 없다는 것도 문제이기도 한다.
아마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의식한 중국 CHRDI가 급히 Z-20형 스텔스 헬기 모형을 공개한 것으로 평가되나, 중국군이 재원과 작전소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미군 따라가기’에 따른 차세대 전력 개발보다, 미군과 태평양 전구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를 고민한 작전개념(CONOP)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며, 이점에서 이번 Z-20형 스텔스 헬기 모형이 또 다른 실패작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위인.교육.기타 > 군대 . 무기. 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군 창군 이래 최초로 무인차량 운영한다! 현대로템 무인차량 육군에 납품 (0) | 2021.07.09 |
|---|---|
| 영천 전투 승리후 노획한 북한 공산군의 무기들과 미군 워커 중장과 한국 육군 백선엽 준장 (0) | 2021.07.08 |
| 한국 세계 8번째 SLBM발사기술 확보, 그런데 핵탄두는? (0) | 2021.07.06 |
| F-22의 파손된 스텔스 도료와 부분도포 작업 (0) | 2021.07.06 |
| 수정) SLBM 바지선 수중 발사 성공 (0) | 2021.07.06 |